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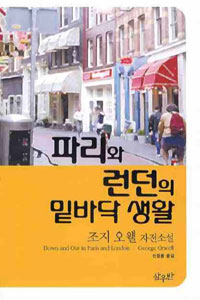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좋은 처방은? 이 책을 손에 들면 어떨까?
책은 훌륭한 처방으로 낙관을 내린다. 밑바닥 생활에는 거의 대책 없을 만큼 극단적인 낙관 말고는 좋은 약이 없다. 거기에다 유머를 고명으로 얹는다. 그 씁쓸한 유머는 목으로 넘어가면서 웃음과 함께 진한 페이소스를 남긴다. 며칠 째 굶어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아사할 상황이 닥치면 침대 밑에서 몇 프랑이 나온다. 기적이다.
책에는 보리스라는 낙관적 인물이 나온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알거지가 되어 파리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군 대위다.
일자리가 없어 찾아간 조지 오웰에게 들려준 그의 낙천을 들어보자. 그 때 보리스는 다리를 심하게 절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가진 것도 전부 저당 잡히자 마침내 며칠 동안 굶은 상태였다.
“원 세상에, 뭐가 걱정인가? 60프랑이라, 거 돈 많네! 어이, 친구, 저기 신발 좀 집어줘. 팔 닿는 대로 저 벌레들 좀 잡아야겠어.”
“아아, 뭔가 나오겠지.”
“조금만 있어 봐, 이 친구야. 굶진 않을 테니 염려 말라니까 그러네. 이건 전쟁의 운세일 뿐이야. 난 더 힘든 궁지에 몰렸던 때도 수십 차례였어. 버텨내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소설가 안정효가 인상적인 인물상으로 추천한 사람답게 보리스를 보노라면 그 낙천에 감탄이 쏟아져 나온다.
그 와중에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다. 그 장면을 읽노라면 사기꾼들의 능수능란한 솜씨와 그 사기꾼들에게 기대를 건 오웰과 보리스의 불운이 손에 잡힐 듯하다.
런던에서는 오웰이 부랑아 생활을 한다. 명문 사립학교 이튼스쿨을 졸업한 오웰로서는 가망 없는 생활이다. 부랑아 수용소는 딱 하루만 재워준다. 부랑아 무리들은 밤새 추위에 떨며 곱은 몸으로 새벽에 잠들고는 다음 날 그 다음 수용소까지 종일 걸어서 이동한다. 이동 중에 오웰은 부랑자 대책을 내놓는다. 그 와중에도 오웰은 어느 곳의 홍차가 맛있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영국인들의 홍차에 대한 집착이란 대단하다.
6. 25 전쟁 중에도 영국 군인은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후 티타임을 즐겼다고 할 정도다.
이 책은 조지 오웰이 1928년부터 31년까지 파리와 런던에서 접시닦이와 부랑자 생활을 체험하면서 쓴 자전적 글이다.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오웰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오웰은 1920년대에 2011년에 사는 우리 삶을 이미 예견했다. “모든 현대적인 이야기에서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벌고, 많이 벌어라 하는 의미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은 미덕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돈은 이제 미덕이 되었다. 아니라고? 아니면 좋겠지만.

인간의 소박한 삶이 박탈된 디스토피아적 가상 현실을 묘사하여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룬 ‘1984년’을 오래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다시 조지 오웰의 삶을 들여다 봅니다. 미안마에서 5년간 식민 관료로 지내다 돌아와 약 30세가 될 때까지 파리와 런던에서 접시닦이, 홈리스 생활을 하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하며...결핵으로 47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시대가 빚어낸 거리 풍경을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을 비켜갈 수는 없었던 혹은 오히려 그 중심에 서려했던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과학의 역사와 더불어 사회사적 경험도 오늘날 보다 진보된 우리 의식의 일부를 이루겠지요. 연청 선생님이 쓰고 계신 소설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